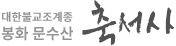내 삶을 바꾼 근간, 기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미령 작성일06-11-23 17:12 조회2,678회 댓글0건본문
둘/ 내 삶을 바꾼 근간, 기도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칼럼니스트)
‘기도’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덥석 승낙은 하였지만 마감을 하루 앞둔 날까지 후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기도’라고 하면 적어도 세상이 무너지듯 기막히게 처절한 고통을 겪거나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사무칠 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그런대로 평탄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나의 삶은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그로 인해 불보살님의 명호를 간절하게 불러본 적이 없기에 기도의 그 깊은 감응을 맛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때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백하자면 나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 예불을 올린다거나 천수경이나 다라니경, 반야심경 같은 경전 독송을 꾸준히 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사찰에 자주 다닌다거나 꽤 명망 있는 스님이 계시다는 절을 부러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말 밤을 이용하여 삼천 배를 올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불교를 강의하는 강사 노릇을 하는 처지이기도 하니 더욱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나도 지금 뭔가 수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확신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나도 내 나름대로 상당히 진지하게 수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나의 기도와 수행은 바로 글을 쓰는 일임을….
한 달에 적게는 5, 6회에서 많게는 10여 회의 칼럼을 써야하는 나는 매번 글을 쓸 때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을 합니다. 주제를 정하고 글을 완성해서 편집인에게 보낼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원고에 대한 생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이런 나를 두고 한 친구는 안타깝다는 듯 “그냥 편하게 써요. 이번 글에 못 다 쓴 이야기는 다음 글에 쓰면 되지요. 글은 그냥 글일 뿐인데 뭘 그렇게 도라도 닦는 것처럼 유난을 떱니까?”라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친구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글 쓰는 일에 그리도 공을 들이는 것일까요?
내가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라는 매우 막연하지만 그 나름대로는 무척이나 절실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울고 학교 가는 ‘이미령’이는 있는데 그게 과연 ‘나’일까, 대체 ‘내’가 누구일까, 나는 지금 살아있기는 한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가, 누가 있어 나를 생각하게 하는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오고 존재해 있었는가…하는 의문이 마구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런 의문에 사무쳐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 수도 없었고 언제나 우울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환각과 환청이 잇따르다가 급기야 뭔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은사이신 고익진 교수님을 뵙고부터입니다. 물론 은사님을 뵙자마자 그 모든 고민과 번민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분은 나에게 해답이나 믿음을 안겨주기 보다는 그런 고민이 참으로 정당하다는 격려와 함께 그 해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머리와 가슴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를 해나가야만 풀린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은사님 덕분에 나는 제대로 고민하고 깊이 사색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게 바로 ‘불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지점에서부터 사색을 출발하도록 일러주셨고 내 머리로 끈질기게 사유하되 결코 비약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입에서 대답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불자라는 말을 쓰기도 어색해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은사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나는 문제(화두) 앞에 나 홀로 남겨졌습니다.
내 삶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평탄하고 무난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끔찍한 지경에 놓인 적도 없었으니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그로 인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적도 맛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내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을 쓸 때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되 나와 내 이웃이 무릎을 탁 칠 정도로 현실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자. 만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006년 오늘 이 현상을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법문을 펼치셨을까 진지하게 따져보자. 솔직하게 쓰자. 절대로 비약하지도 말 것이며,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깊어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다짐 아래 오늘도 나는 하얀 백지 같은 모니터를 앞에 두고 글을 씁니다. 사람들의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관해서 글을 쓰는 순간이면 그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자가 됩니다. 내 존재 이유와 참다운 존재방식을 알지 못해 그토록 방황하던 때, 은사님 아래에서 조심조심 발자국을 옮겨놓던 그 진지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내가 자신을 속이는 글을 쓰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을 칩니다. 그러다보니 글을 쓸 때 주제를 정하고 완성하는 동안 내 마음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번민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내가 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바뀔 때까지 나의 글쓰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한은 나는 영원히 구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로 인해 내 삶은 끊임없이 달라지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