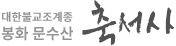핑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축서사 작성일08-11-03 14:26 조회2,994회 댓글0건본문
기후스님
3년 3개월이 모자라는 세월을 구마동에서 혼자 지내다가 해제를 15일 정도 남겨둔 7월말에 다시 걸망을 짊어지고 이곳 축서사로 오게 되었다.
옛 스님들의 말 가운데 결제중에 돌아다니는 승려는 천명을 타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상기해 보면 나도 이젠 간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 모양이다. 그 만큼 타성과 요령에 쩔었고 산중 때가 덕지덕지 묻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게다. 처음 구마동에 새집을 지어 들어갈 땐 ‘공기와 물이 좋고 또한 조용한 이곳에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는 속마음이 있었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보니 그 초심에 약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처음 그곳에 갈 땐 어떤 분이 ‘전기만 들어오면 스님 시중을 들면서 자신도 수행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은근히 그이에게 좀 기댈 생각을 했었는데 전봇대가 세워지고 있는 지금에 와선 손자를 돌봐야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심장이 약한 내가 그 깊은 산중에 살다가 급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차도 없고 전화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스님 걱정만 끼친다.’면서 도리어 날 생각해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그분의 속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핑계거리는 연극배우처럼 다양한 모습의 변화와 무궁한 변신을 시도하며 그 끈질긴 생명력을 지금까지 부지하고 있는가 보다.
자고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듯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어떤 조건과 소재가 도처에 널려 있는 중생의 세계, 그래서 현재적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재미있게 엮어져 있음을 이따금씩 느끼곤 한다. 나 자신 또한 도와준다던 그분의 말처럼 도리천을 떠날 궁리를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뚜렷한 핑계 댈 것이 없어서 미적거리고 있던 터였다. 너무나 추운 겨울을 눈 속에서 두 번이나 지내고나니 이젠 찬바람이 무서워서 올 겨울엔 어디로 한번 움직여 볼까 하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때맞춰 물난리를 겪게 된 것이다.
그날은 무척 후텁지근하였고 바람도 없었다. 두텁고 무겁게 느껴지는 한 떼의 시커먼 구름들로 뒤덮힌 백두대간은 전기 없는 그곳을 한층 더 캄캄한 기운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이윽고 방안의 물건들이 훤하게 보일 정도의 밝은 번갯불이 마치 폭죽을 터트리듯 주기적으로 이어졌고 뒤따라 태백산을 울렁거리게 하는 강한 천둥소리가 7평 반의 도리천 서까래를 흔들거리게 만들었다. 그런 요란스런 상황 속에서 어둠을 감싸 안고 쏟아지는 폭우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뒤이어 큰 돌들이 물과 함께 굴러가는 소리가 구마동을 삼킬 듯 요란 해지면서, 나무들이 부서지는 우지직 하는 소리와 우루루 쾅쾅하는 천둥소리가 그곳에 더해져서 그야말로 그 모든 소리 소리들이 함께 어울리어 적막강산 도리천을 완전하게 삼켜 버릴듯한 기세였다. 난 이불을 뒤집어쓰고 죽은 듯이 누워서 그저 물이 집까지 차오르지 않거나 뒷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어서 빨리 비가 멎기만을 기다리며 뜬눈으로 그 밤을 지샜다.
시작엔 끝이 있는 법이라 산창이 훤해질 무렵 빗방울은 귀신처럼 사라졌으나 그들이 내리쏟고 지나간 그 자리는 하룻밤 사이에 신천지를 만들었다. 시멘트와 자갈을 비벼 넣어 제법 튼튼하게 만들었던 다리 곁 큰 대문 한 짝은 1.5km 떨어져 있는 팬션 집 앞 냇가에 처박혀 있었고 징검다리 옆 언덕에 마치 도리천의 문지기인 양 우뚝 서 버티고 있던 고목 소나무와 큰 버드나무 두 그루 그리고 열목어와 산천어 등이 살랑거리며 드나들던 사자머리처럼 생긴 큰 바위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많던 고기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실로 엄청난 변화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그 큰 자연의 위력 앞에 선 무기력한 인간, 그들은 보란 듯이 인간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 다리와 길들을 모두 부셔 버리고 도도하게 그곳을 점령하여 흐르고 있었다.
인간에겐 유실이요, 재앙이겠으나 그들의 입장에선 어찌보면 원상회복이요, 자연스러움인지도 모를 일이다. 난 그날 밤의 폭우 핑계 덕분에 슬그머니 이곳 축서사에 다시 와서 하루 15시간의 용맹정진을 하고 있는 적묵당의 선객들을 바라보면서 그리 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잘 지내게 되었으니 그 핑계거리가 무척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 때론 따분하고 머슥한 중생의 세계,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만일에 그때 따라 둘러댈 그 어떤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만이 갖고 있다는 화병 환자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다양한 색깔의 핑계만큼이나 인간의 삶의 모습과 그 내용도 천층만층이다. 도라지를 캐러가는 보라색 빛깔의 사랑의 핑계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기에 헤어진다는 다소 아리송한 핑계도 있다. 물이 안 맞아 그 절을 떠나야 된다는 억지 핑계도 있지만 배가 아파 학교에 못 간다는 속임수 핑계도 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삶의 동선에 완급을 조절하고 이해득실을 계산하며 오늘을 꾸려가는 뭇 사람들. 그 핑계에 고사라도 한번 지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잦은 것은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핑계가 본인들의 마음의 짐을 덜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결국 아름다운 삶을 꾸려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핑계가 자칫하면 거짓말의 사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발판 구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수각 등 너머에 푹 파묻혀 있는 북암에서 큰 절로 가는 오솔길엔 벌써 도토리 껍질이 떨어지고, 새벽 3시에 전등불을 비추며 가는 그 숲길엔 이미 찬 기운이 길 섶으로 모여든다.
총총 뜬 별빛, 잔잔하게 울어대는 풀벌레들의 노랫소리, 새벽이 내려주는 문수산 축서사의 그 상큼한 새벽공기를 가슴에 담고 경건하고 장엄스럽게 드리는 이곳의 새벽예불, 선원과 후원의 모든 대중이 함께 모여 합장하고 머리 조아려 깊고도 천천하게 예경하는 지심귀명례, 그 운율의 뜻이 심장에 스며들어 감전된 듯 전신에 스민다.
이렇게 1400여 년을 귀의의 도량으로 터를 닦고 축을 쌓은 의상대사님과 그 후예들 그리고 이 칼칼한 도량에 함께 될 인연 있어 각자의 위치에서 정성 다해 애쓰는 사부대중들의 마음씀과 손발 놀림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핑계 없어 머뭇거리게 하던 본인에게 뒤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나오게 해 준 큰 비 덕분에 차려주는 밥상과 함께 예불 드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게 된다. 그 변화의 속성에서 여물어져 가는 삶의 마디, 이러다가 또 다시 축서사를 떠나게 될 땐 그땐 무슨 핑계를 대면서 걸망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을까? 짐짓 생각해 보면 우습고도 재미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