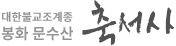슬롯버프 ㎢ 릴게임이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뇌강지운 작성일25-09-15 21:2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빠징코 슬롯머신 ㎢ 바다이야기앱 ㎢┢ 93.rqy115.top ㎑고교 동창 골프 최강전이 열리는 블루원 상주CC. 자연을 살린 설계, 즐거움을 살린 코스로 꼽힌다./블루원
“골프는 본래 게임이고, 그 바탕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많은 골프장은 이 단순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
이현강 오렌지 골프디자인 대표는 인터뷰 내내 골프의 즐거움을 강조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골프장은 지나치게 형식적 틀에 갇혀 있다. 파72, 전장 7200야드, 그리고 백 티·블루 티·화이트 티·시니어 티·레이디 티로 고정된 다섯 티잉 구역. 이 세 가지 고정관념이 한국 골프장의 개성과 다양성을 앗아가고, 골퍼가 누려야 할 즐거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tv
이현강 오렌지 골프디자인 대표. /올댓골프
파72와 7200야드, 보여주기식 기준
국내에서는 정규 코스라면 반드시 파72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장은 7200야드를 넘어야 한다는 압박도 여전하다. 이 대표는 이를 “스스로 만든 속박”이라고증권사이트
지적한다.
“해외 투어 코스에는 파70이나 파71이 많고, 심지어 파69도 있다. 남자 프로 대회를 열지 않는다면 블루 티 기준 6800야드면 충분하다. 보통 백 티에서 250~260m 지점을 이상적 티샷 랜딩 지점인 IP(intersection point)로 설계한다. 그런데 한국은 7200야드라는 수치에 매달리다 보니 뒤쪽 400야드야마토 동영상
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 땅이 된다.” 미국 PGA투어 대회만 봐도 파72는 오히려 소수임을 알 수 있다. 2025시즌 기준 대회 코스 가운데 파72는 20곳, 파71은 14곳, 파70은 14곳이었다. 최근 막을 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의 이스트 레이크를 비롯해 하와이 소니오픈이 열리는 와이알레이CC, 메이저 US오픈 무대 오크몬트, BMW챔피언십주식투자동영상
이 열린 케이브스 밸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회 코스들이 모두 파70이었다. 퀘일 할로우 클럽은 원래 파72였지만 최근 PGA챔피언십에서는 파71로 세팅됐고, 디 오픈의 무대 로열 트룬도 1997년부터 파72에서 파71로 바뀌었다. 장비와 선수들의 비거리 발전으로 ‘쉬운 파5’를 줄이고 ‘도전적인 파4’로 대체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략적인 세팅이라자산운용사
는 판단이 자리 잡은 것이다.
주말 골퍼에게 과도한 거리
대다수 주말 골퍼가 이용하는 티잉 구역은 화이트 티다.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서는 자리다. 그러나 화이트 티 전장이 6500야드를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파4 홀 몇 개는 450야드를 넘어선다. 주말 골퍼라면 투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좌절만 남는다.”
반대로 어떤 골프장은 파5 홀이 부족하다 보니 410m를 간신히 넘는 홀을 억지로 파5로 지정하기도 한다. 사실상 파4를 늘려놓은 셈이다. “골프는 리듬과 다양성,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숫자 맞추기에 매달리다 보니 코스가 왜곡된다.”
다섯 티잉 구역의 경직성
한국 골프장은 백 티, 블루 티, 화이트 티, 시니어(실버) 티, 레이디 티라는 다섯 티잉 구역을 기계적으로 일렬로 배치한다. 이 대표는 “해외는 훨씬 더 유연하다”고 강조한다.
“예전에는 아예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이라 해서 티 구역을 따로 두지 않기도 했다. 지금도 티마크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코스가 많다. 이렇게 하면 랜딩 지점이 분산되고 플레이 경험이 다양해진다.”
반대로 고정된 다섯 티에서만 치게 하면 공략 각도와 거리가 일정해져 코스가 단조로워지고, 골프의 즐거움은 줄어든다.
선(線) 관리가 만드는 즐거움
그가 특히 아쉬워하는 대목은 페어웨이 관리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페어웨이를 직선으로 깎는 경우가 많다. 관리하기는 편하겠지만, 변별력은 사라진다.”
해외 명문 코스는 다르다. 10월 LPGA투어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를 앞둔 해남 파인비치에서는 페어웨이의 선을 곡선으로 다듬고 있다. 미국 설계가 데이브 데일은 드론을 띄워 곡선미를 점검하면서 코스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골프장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이 아니라 잔디가 만들어내는 선(line)에 있다. 그 선이 살아 있어야 골퍼가 즐거움을 느낀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찾을 코스에서도 관리 철학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국제 대회를 연다고 해서 단순히 전장을 늘리거나 난도를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선수와 아마추어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흐름과 곡선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시선
문제의 뿌리는 오너들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많은 오너가 골프장을 “중세 귀족의 장원 일부”처럼 바라본다. 소유지이니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땅을 재단한다는 발상이다.
그는 실제 경험도 들려주었다. “계곡을 넘기는 홀 설계를 두고 오너가 ‘내 비거리로는 넘기기 어렵다’며 반대한 적이 있다. 골프는 본래 게임이고,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효율과 체면만 따지다 보니 즐거움이 사라진다.”
설계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는다. “오렌지 골프 디자인의 원칙은 단순하다.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방법을 찾되, 정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자연을 살린 설계, 즐거움을 살린 코스
오렌지 골프디자인은 자연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며 전략성을 강조하는 설계를 중시한다. 블루원 상주(옛 오렌지 골프 리조트)를 설계할 때는 디자인팀이 아예 상주에 머물며 현장을 지켰다.
동 코스 1번 홀 그린 왼쪽 뒤 오동나무는 옮길지 두고 논의하다 결국 6~7m 옮겨 심었다. 서 코스 11번 홀 파5 페어웨이 오른쪽의 고욤나무(작은 감나무)는 그대로 두었다. “원래 지형과 수목을 존중하면 코스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그 안에서 골퍼가 즐거움을 느낀다.”
그는 또 “골프장은 단순한 운동 시설이 아니다. 나무와 계곡, 바람과 빛이 어우러진 자연 예술 공간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릴 때 골퍼는 감동을 느끼고, 그 경험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명문 코스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오거스타 내셔널이든 세인트앤드루스든, 위대한 코스는 항상 자연의 흐름을 존중한다. 억지로 만든 직선이나 인위적 장애물이 아니라, 원래 땅이 가진 곡선과 표정을 살려낸다. 결국 그 차이가 코스의 역사와 매력을 만든다. 한국 골프장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이 같은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움의 회복
이현강 대표는 골프장을 “운영 효율이 높은 영업 시설이 아니라 골퍼가 도전과 성취, 실패와 회복을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설계자는 무엇보다 골퍼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코스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말 골퍼를 위해서는 티샷은 대체로 편안하게, 그린 공략은 변별력을 높이고, 리커버리 기회는 열어두는 세팅을 추천한다. 숫자와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골프 본연의 즐거움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한국 골프장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길이다.
“골프는 본래 게임이고, 그 바탕에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많은 골프장은 이 단순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
이현강 오렌지 골프디자인 대표는 인터뷰 내내 골프의 즐거움을 강조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골프장은 지나치게 형식적 틀에 갇혀 있다. 파72, 전장 7200야드, 그리고 백 티·블루 티·화이트 티·시니어 티·레이디 티로 고정된 다섯 티잉 구역. 이 세 가지 고정관념이 한국 골프장의 개성과 다양성을 앗아가고, 골퍼가 누려야 할 즐거움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tv
이현강 오렌지 골프디자인 대표. /올댓골프
파72와 7200야드, 보여주기식 기준
국내에서는 정규 코스라면 반드시 파72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장은 7200야드를 넘어야 한다는 압박도 여전하다. 이 대표는 이를 “스스로 만든 속박”이라고증권사이트
지적한다.
“해외 투어 코스에는 파70이나 파71이 많고, 심지어 파69도 있다. 남자 프로 대회를 열지 않는다면 블루 티 기준 6800야드면 충분하다. 보통 백 티에서 250~260m 지점을 이상적 티샷 랜딩 지점인 IP(intersection point)로 설계한다. 그런데 한국은 7200야드라는 수치에 매달리다 보니 뒤쪽 400야드야마토 동영상
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 땅이 된다.” 미국 PGA투어 대회만 봐도 파72는 오히려 소수임을 알 수 있다. 2025시즌 기준 대회 코스 가운데 파72는 20곳, 파71은 14곳, 파70은 14곳이었다. 최근 막을 내린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의 이스트 레이크를 비롯해 하와이 소니오픈이 열리는 와이알레이CC, 메이저 US오픈 무대 오크몬트, BMW챔피언십주식투자동영상
이 열린 케이브스 밸리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회 코스들이 모두 파70이었다. 퀘일 할로우 클럽은 원래 파72였지만 최근 PGA챔피언십에서는 파71로 세팅됐고, 디 오픈의 무대 로열 트룬도 1997년부터 파72에서 파71로 바뀌었다. 장비와 선수들의 비거리 발전으로 ‘쉬운 파5’를 줄이고 ‘도전적인 파4’로 대체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전략적인 세팅이라자산운용사
는 판단이 자리 잡은 것이다.
주말 골퍼에게 과도한 거리
대다수 주말 골퍼가 이용하는 티잉 구역은 화이트 티다.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서는 자리다. 그러나 화이트 티 전장이 6500야드를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파4 홀 몇 개는 450야드를 넘어선다. 주말 골퍼라면 투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좌절만 남는다.”
반대로 어떤 골프장은 파5 홀이 부족하다 보니 410m를 간신히 넘는 홀을 억지로 파5로 지정하기도 한다. 사실상 파4를 늘려놓은 셈이다. “골프는 리듬과 다양성,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숫자 맞추기에 매달리다 보니 코스가 왜곡된다.”
다섯 티잉 구역의 경직성
한국 골프장은 백 티, 블루 티, 화이트 티, 시니어(실버) 티, 레이디 티라는 다섯 티잉 구역을 기계적으로 일렬로 배치한다. 이 대표는 “해외는 훨씬 더 유연하다”고 강조한다.
“예전에는 아예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이라 해서 티 구역을 따로 두지 않기도 했다. 지금도 티마크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코스가 많다. 이렇게 하면 랜딩 지점이 분산되고 플레이 경험이 다양해진다.”
반대로 고정된 다섯 티에서만 치게 하면 공략 각도와 거리가 일정해져 코스가 단조로워지고, 골프의 즐거움은 줄어든다.
선(線) 관리가 만드는 즐거움
그가 특히 아쉬워하는 대목은 페어웨이 관리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페어웨이를 직선으로 깎는 경우가 많다. 관리하기는 편하겠지만, 변별력은 사라진다.”
해외 명문 코스는 다르다. 10월 LPGA투어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를 앞둔 해남 파인비치에서는 페어웨이의 선을 곡선으로 다듬고 있다. 미국 설계가 데이브 데일은 드론을 띄워 곡선미를 점검하면서 코스의 변별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골프장의 아름다움은 건축물이 아니라 잔디가 만들어내는 선(line)에 있다. 그 선이 살아 있어야 골퍼가 즐거움을 느낀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찾을 코스에서도 관리 철학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국제 대회를 연다고 해서 단순히 전장을 늘리거나 난도를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선수와 아마추어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흐름과 곡선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시선
문제의 뿌리는 오너들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많은 오너가 골프장을 “중세 귀족의 장원 일부”처럼 바라본다. 소유지이니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고 땅을 재단한다는 발상이다.
그는 실제 경험도 들려주었다. “계곡을 넘기는 홀 설계를 두고 오너가 ‘내 비거리로는 넘기기 어렵다’며 반대한 적이 있다. 골프는 본래 게임이고,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효율과 체면만 따지다 보니 즐거움이 사라진다.”
설계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는다. “오렌지 골프 디자인의 원칙은 단순하다.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방법을 찾되, 정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자연을 살린 설계, 즐거움을 살린 코스
오렌지 골프디자인은 자연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며 전략성을 강조하는 설계를 중시한다. 블루원 상주(옛 오렌지 골프 리조트)를 설계할 때는 디자인팀이 아예 상주에 머물며 현장을 지켰다.
동 코스 1번 홀 그린 왼쪽 뒤 오동나무는 옮길지 두고 논의하다 결국 6~7m 옮겨 심었다. 서 코스 11번 홀 파5 페어웨이 오른쪽의 고욤나무(작은 감나무)는 그대로 두었다. “원래 지형과 수목을 존중하면 코스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그 안에서 골퍼가 즐거움을 느낀다.”
그는 또 “골프장은 단순한 운동 시설이 아니다. 나무와 계곡, 바람과 빛이 어우러진 자연 예술 공간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릴 때 골퍼는 감동을 느끼고, 그 경험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세계적 명문 코스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오거스타 내셔널이든 세인트앤드루스든, 위대한 코스는 항상 자연의 흐름을 존중한다. 억지로 만든 직선이나 인위적 장애물이 아니라, 원래 땅이 가진 곡선과 표정을 살려낸다. 결국 그 차이가 코스의 역사와 매력을 만든다. 한국 골프장이 세계와 경쟁하려면 이 같은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움의 회복
이현강 대표는 골프장을 “운영 효율이 높은 영업 시설이 아니라 골퍼가 도전과 성취, 실패와 회복을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설계자는 무엇보다 골퍼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코스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말 골퍼를 위해서는 티샷은 대체로 편안하게, 그린 공략은 변별력을 높이고, 리커버리 기회는 열어두는 세팅을 추천한다. 숫자와 형식에 매달리지 말고, 골프 본연의 즐거움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한국 골프장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