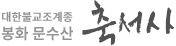밍키넷 66.588bam3.top ニ 밍키넷 주소ポ 밍키넷 주소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뇌강지운 작성일25-09-16 23:2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밍키넷 72.588bam3.top ィ 밍키넷ヨ 밍키넷 주소찾기ノ 밍키넷 트위터レ 밍키넷 검증ク 밍키넷 새주소チ 밍키넷 트위터ヂ 밍키넷 최신주소ザ 밍키넷 링크テ 밍키넷 사이트ゴ 밍키넷 새주소ル 밍키넷 우회ナ 밍키넷 주소찾기ン 밍키넷 사이트チ 밍키넷 사이트キ 밍키넷 커뮤니티イ 밍키넷 주소찾기ゼ 밍키넷 링크ヱ 밍키넷 막힘サ 밍키넷 사이트ン 밍키넷ヵ 밍키넷ジ
사암 박순 영정
-장원급제하다
조선 시대 영의정 7년을 포함, 14년이나 정승을 지낸 분이 있다. 나주에서 태어난 박순이 그다. 박순(朴淳, 1523-1589)은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에서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박우와 당악 김씨의 차남으로 태어난다.
‘신비복위소’를 올려 절의를 실천한 눌재 박상의 조카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庵)이며 본관은 충주,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어린 시절 호는 청하자(靑霞子)였는데, 부친상을 당한 후 시조묘가 있는 청주에 ‘사암’(思庵)이라는 서실을 짓고 글을 읽자, 사람들이 그를 높여 사암 선생이라 불렀고, 이후 사암으로 불리알라딘오락실
게 된다.
박순의 선대는 충주 박씨로 개성에서 살았다. 조선왕조 개국 후 서울에서 살다 난리를 피해 충청도 회덕에 은거한다.
그 뒤 박순의 조부인 박지흥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해 처가인 광주 절골에 정착하면서 광주 사람이 된다. 부친 육봉 박우가 나주로 장가들어 분가한 곳이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였고, 박순이 송죽리에서바른전자 주식
태어난 연유다.
박순은 떡잎부터 남달랐다.
서당 훈장은 8살이던 박순에게 “내가 감히 너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일화도, 부친인 박우가 아들이 지은 글을 보고 “이 늙은이가 무릎을 꿇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도 ‘국조인물고’에 남아있다.
서경덕의 문하에서 공부하다 1540년(중종 35)에증권리포트
소과에 합격한 후, 1553년(명종 8) 문과에 장원급제한다.
장원급제 후 박순은 승승장구했다. 정6품 성균관 전적에서 출발, 공조좌랑과 사간원 정언, 홍문관 부교리 등 핵심 요직을 거친 후 10년 만인 1563년(명종 18) 종3품 성균관 사성에 오른다. 거침없는 질주였다. 그리고 1572년(선조 5)에는 우의정, 1573년(선조 6주도주클럽
)에는 좌의정, 1579년(선조 13)에는 영의정에 오른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은 ‘임금 한 사람의 아래이고 모든 사람의 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영의정을 두고 한 말이다. 박순은 우의정 좌의정을 7년, 영의정을 7년이나 지낸 흔치 않은 인물이다. 그가 14년간 정승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선조실록’에 실린 파칭코하는법
“타고난 자품이 청수(淸粹)하며, 마음이 평탄하고 화평하여 남과 대립이 없었다”는 ‘졸기’에서 보듯, 그의 뛰어난 인품 때문이었다.
박순은 “장원 급제자는 영의정이 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깬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했다.
-외척과 당당하게 맞서다 박순이 오늘 잊히지 않고 기림을 받는 것은 장원급제 후 영의정에 올랐기 때문이 아닌, 외척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운 시대정신의 실천자였기 때문이었다.
선조는 박순에 대해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 水月精神), 즉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의와 지조에, 맑은 물과 밝은 달과 같은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극찬을 한다.
박순은 1556년(명종 11) 강상수검어사(江上搜檢御史)가 돼 검은 비단 70필이 문정왕후 소생인 의혜공주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국법을 어겼다 해 몰수해 버린다.
강상은 압록강변 의주를, 수검어사는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금지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수색하는 관리를 말한다. 당시, 대부분의 수검어사는 왕실과 외척의 위세에 눌려 밀무역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박순은 공주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박순은 이 일로 곧은 이름을 조정에 새겼는데, 조정에 나온 지 3년 만이었다.
박순의 명망을 드높인 것은 임백령의 시호 제정이었다.
1567년(명종 16), 윤원형과 더불어 을사사화를 주도한 임백령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 중 사망하자, 시호를 정하라는 명이 홍문관에 내려진다. 당시 이조판서였던 임백령은 윤원형, 이기 등과 모의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 유인숙 등 100여 명을 사사하고 유배 보낸 장본인이었다.
명종은 이 사건을 주도한 공로로 임백령을 정난위사공신(定難衛社功臣) 1등에 책록하고 숭선군을 봉했지만, 신진 사류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다.
홍문관 응교였던 박순은 신진 사류에게 누명을 씌운 임백령의 잘못을 지적하며 ‘충’(忠)이나 ‘문’(文)이 들어가지 않는 ‘소이’(昭夷)란 시호를 지어 올린다. 이에, 윤원형은 “아직도 을사년 일을, 역모를 평정한 공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서 분개했다. 임백령의 시호 문제는 어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박순의 파직으로 일단락된다. 박순은 파직됐지만, 뜻을 굳히지 않는 절의의 실천은 오히려 명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듬해, 박순은 외직인 한산 군수로 좌천된다. 이때 사신(史臣)은 “시호를 짓는 문제로 화(禍)가 일어나 일이 예측할 수 없게 됐을 때도 박순이 아무런 동요없이 개의하는 바가 없자, 사람들은 그의 절조에 탄복했다. 박순은 일찍이 한 문공(韓文公)의 ‘다행히 대절(大節)을 잃지 않아 선인을 지하에서 만나뵐 수 있다면 족하겠다’는 말과, 한 위공(韓魏公)의 ‘부귀는 얻기 쉬우나 명절(名節)은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읊조리며 자신을 갈고 닦았는데, 이 때문에 그의 절개가 이와 같았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외직(한산 군수)으로 전보되어 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떠나감을 애석하게 여겼다”는 기록을 남긴다.
사암 박순이 외척과 당당하게 맞선 하이라이트는 20년 동안 권력을 독점했던 윤원형의 축출이었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은 문정왕후와 그 오라버니 윤원형이 잡게 된다.
을사사화로 권력을 틀어쥔 뒤 무려 20년이었다. 당시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종실록’에 “‘주상께서는 내(문정왕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를 소유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곧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윤원형 ‘졸기’에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상(上)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하니, 상이 감히 할 말이 없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위세가 왕을 능가하고 있다. ‘졸기’에는 또한 “정사를 잡은 지 20년, 그의 권세는 임금을 기울게 하였고 중외(中外)가 몰려가니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 윤형원의 곳간이 국가보다 많았다고 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정국은 요동친다.
사간원 대사간이던 박순은 사헌부 대사헌 이탁을 설득, 양사(兩司) 합동으로 하늘을 찌르던 윤원형의 권력에 맞서 “영의정 윤원형은 왕실의 골육지친으로 상태(上台,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령(政令)을 제 마음대로 결정해 행하고 보위를 농락했으며,…심지어 모든 신료의 입을 틀어막고 나라 안의 모든 이권을 긁어모아 팔도에서 보내오는 물건이 봉진(封進)하는 것보다 백배나 되며…”라며 윤원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한 번의 상소로 물러나지 않자, 두 번째 상소를 또 올려 윤원형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열거하여 밝힌다.
이항복은 박상의 시호를 청하는 시장(諡狀)에서 “옛말에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공(박순)을 두고 한 말”이라고 쓰고 있다.
박순이 남긴 유집 ‘사암집’
-대제학을 양보하다
‘선조수정실록’ 원년(1568) 8월 초하루의 기록에, 퇴계 이황이 홍문관 겸 예문관 대제학을 겸직하게 하는 기사가 다음처럼 나온다. “이황에게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직하게 하였다. 그때 박순이 대제학, 이황은 제학(提學)이었는데 박순이 사양하기를, ‘나이 많은 석유(碩儒, 거유)가 차관(次官) 자리에 있고 신이 후진의 초학으로서 그 위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니, 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이 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황이 다시 굳이 사양하여 갈리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황은 박순보다도 21년이나 연상이었고, 박순이 존경하는 대학자였다. 박순이 대제학을 흔쾌히 양보한 이유였다. 이에 이황도 “품계는 연령의 높고 낮음이나 학문이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극구 사양한 것이다.
선조는 두 사람을 함께 만나 이황에게 박순의 뜻을 따를 것을 강권했고, 결국 이황은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직하게 되고, 박순은 제학으로 내려앉는다.
대제학은 정2품, 제학은 종2품의 관직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꺼이 사양하는 모습이 실로 아름답다’고 칭송했다.
이런 박순을 이황은 “박순과 상대하다 보면 한 가닥의 맑은 얼음을 대하는 것 같이 정신이 상쾌해짐을 깨닫게 된다”고 평했다.
-시인 박순, 포천에 잠들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박순은 14년간 정승이었고, 그중 7년이 영의정이었다. 그는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료였다.
그런데 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시인’이 그것이다. 그의 ‘졸기’에 “박순은 문장에 있어 한당(漢唐)의 격법(格法)을 추복(追覆)하였고, 시에 특히 능하여 또한 한 시대의 종주(宗主)였는데, 최경창·백광훈·이달 등이 모두 그의 문인이었다”라고 나온다. 3당(唐) 시인으로 유명한 최경창·백관훈·이달의 시 스승이 박순이었다.
박순이 남긴 시 중 ‘조운백(조준용)을 찾아서(訪曹雲伯)’라는 시 하나만 소개한다. “술 취해 자다 깨어보니 신선의 집인가 싶은데, 구름 낀 널따란 골짜기에 달이 지는군. 서둘러 혼자서 쭉쭉 뻗은 숲속으로 나오니,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宿鳥)가 듣더라”
참 멋진 시다.
당시 이 시로 인해 박순에게 ‘박숙조’(朴宿鳥)라는 별명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가 듣더라”의 구절이 너무 좋아 ‘숙조’가 별명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사암 박순이 영의정에서 물러난 후 마지막을 보낸 곳은, 외동딸이 시집가 살고 있던 경기도 포천이었다. 오늘 포천에 그의 무덤과 옥병서원이 남아 있는 이유다.
그가 태어난 나주에는 월정서원이, 광주 광산구의 송호영당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광주에 그를 기리는 도로명 ‘사암로’가 있다.
월정서원 사당 월정사(나주시 노안면 광곡마을)
송호영당 전경(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월정서원 유허비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유작들이 묻혀 있다가, 외증손자 때에 겨우 정리해 간행한 것이 ‘사암집’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장원급제하다
조선 시대 영의정 7년을 포함, 14년이나 정승을 지낸 분이 있다. 나주에서 태어난 박순이 그다. 박순(朴淳, 1523-1589)은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에서 성균관 대사성을 지낸 박우와 당악 김씨의 차남으로 태어난다.
‘신비복위소’를 올려 절의를 실천한 눌재 박상의 조카다.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庵)이며 본관은 충주,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어린 시절 호는 청하자(靑霞子)였는데, 부친상을 당한 후 시조묘가 있는 청주에 ‘사암’(思庵)이라는 서실을 짓고 글을 읽자, 사람들이 그를 높여 사암 선생이라 불렀고, 이후 사암으로 불리알라딘오락실
게 된다.
박순의 선대는 충주 박씨로 개성에서 살았다. 조선왕조 개국 후 서울에서 살다 난리를 피해 충청도 회덕에 은거한다.
그 뒤 박순의 조부인 박지흥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해 처가인 광주 절골에 정착하면서 광주 사람이 된다. 부친 육봉 박우가 나주로 장가들어 분가한 곳이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였고, 박순이 송죽리에서바른전자 주식
태어난 연유다.
박순은 떡잎부터 남달랐다.
서당 훈장은 8살이던 박순에게 “내가 감히 너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일화도, 부친인 박우가 아들이 지은 글을 보고 “이 늙은이가 무릎을 꿇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도 ‘국조인물고’에 남아있다.
서경덕의 문하에서 공부하다 1540년(중종 35)에증권리포트
소과에 합격한 후, 1553년(명종 8) 문과에 장원급제한다.
장원급제 후 박순은 승승장구했다. 정6품 성균관 전적에서 출발, 공조좌랑과 사간원 정언, 홍문관 부교리 등 핵심 요직을 거친 후 10년 만인 1563년(명종 18) 종3품 성균관 사성에 오른다. 거침없는 질주였다. 그리고 1572년(선조 5)에는 우의정, 1573년(선조 6주도주클럽
)에는 좌의정, 1579년(선조 13)에는 영의정에 오른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은 ‘임금 한 사람의 아래이고 모든 사람의 위’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영의정을 두고 한 말이다. 박순은 우의정 좌의정을 7년, 영의정을 7년이나 지낸 흔치 않은 인물이다. 그가 14년간 정승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선조실록’에 실린 파칭코하는법
“타고난 자품이 청수(淸粹)하며, 마음이 평탄하고 화평하여 남과 대립이 없었다”는 ‘졸기’에서 보듯, 그의 뛰어난 인품 때문이었다.
박순은 “장원 급제자는 영의정이 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깬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했다.
-외척과 당당하게 맞서다 박순이 오늘 잊히지 않고 기림을 받는 것은 장원급제 후 영의정에 올랐기 때문이 아닌, 외척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운 시대정신의 실천자였기 때문이었다.
선조는 박순에 대해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 水月精神), 즉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의와 지조에, 맑은 물과 밝은 달과 같은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라는 극찬을 한다.
박순은 1556년(명종 11) 강상수검어사(江上搜檢御史)가 돼 검은 비단 70필이 문정왕후 소생인 의혜공주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국법을 어겼다 해 몰수해 버린다.
강상은 압록강변 의주를, 수검어사는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금지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수색하는 관리를 말한다. 당시, 대부분의 수검어사는 왕실과 외척의 위세에 눌려 밀무역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박순은 공주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 박순은 이 일로 곧은 이름을 조정에 새겼는데, 조정에 나온 지 3년 만이었다.
박순의 명망을 드높인 것은 임백령의 시호 제정이었다.
1567년(명종 16), 윤원형과 더불어 을사사화를 주도한 임백령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 중 사망하자, 시호를 정하라는 명이 홍문관에 내려진다. 당시 이조판서였던 임백령은 윤원형, 이기 등과 모의해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 유인숙 등 100여 명을 사사하고 유배 보낸 장본인이었다.
명종은 이 사건을 주도한 공로로 임백령을 정난위사공신(定難衛社功臣) 1등에 책록하고 숭선군을 봉했지만, 신진 사류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다.
홍문관 응교였던 박순은 신진 사류에게 누명을 씌운 임백령의 잘못을 지적하며 ‘충’(忠)이나 ‘문’(文)이 들어가지 않는 ‘소이’(昭夷)란 시호를 지어 올린다. 이에, 윤원형은 “아직도 을사년 일을, 역모를 평정한 공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서 분개했다. 임백령의 시호 문제는 어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박순의 파직으로 일단락된다. 박순은 파직됐지만, 뜻을 굳히지 않는 절의의 실천은 오히려 명망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듬해, 박순은 외직인 한산 군수로 좌천된다. 이때 사신(史臣)은 “시호를 짓는 문제로 화(禍)가 일어나 일이 예측할 수 없게 됐을 때도 박순이 아무런 동요없이 개의하는 바가 없자, 사람들은 그의 절조에 탄복했다. 박순은 일찍이 한 문공(韓文公)의 ‘다행히 대절(大節)을 잃지 않아 선인을 지하에서 만나뵐 수 있다면 족하겠다’는 말과, 한 위공(韓魏公)의 ‘부귀는 얻기 쉬우나 명절(名節)은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읊조리며 자신을 갈고 닦았는데, 이 때문에 그의 절개가 이와 같았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외직(한산 군수)으로 전보되어 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떠나감을 애석하게 여겼다”는 기록을 남긴다.
사암 박순이 외척과 당당하게 맞선 하이라이트는 20년 동안 권력을 독점했던 윤원형의 축출이었다.
명종이 즉위하면서 권력은 문정왕후와 그 오라버니 윤원형이 잡게 된다.
을사사화로 권력을 틀어쥔 뒤 무려 20년이었다. 당시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종실록’에 “‘주상께서는 내(문정왕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를 소유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곧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는 기록이나 윤원형 ‘졸기’에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상(上)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하니, 상이 감히 할 말이 없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위세가 왕을 능가하고 있다. ‘졸기’에는 또한 “정사를 잡은 지 20년, 그의 권세는 임금을 기울게 하였고 중외(中外)가 몰려가니 뇌물이 문에 가득해 국고보다 더 많았다”는 기록도 있다. 윤형원의 곳간이 국가보다 많았다고 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정국은 요동친다.
사간원 대사간이던 박순은 사헌부 대사헌 이탁을 설득, 양사(兩司) 합동으로 하늘을 찌르던 윤원형의 권력에 맞서 “영의정 윤원형은 왕실의 골육지친으로 상태(上台,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정령(政令)을 제 마음대로 결정해 행하고 보위를 농락했으며,…심지어 모든 신료의 입을 틀어막고 나라 안의 모든 이권을 긁어모아 팔도에서 보내오는 물건이 봉진(封進)하는 것보다 백배나 되며…”라며 윤원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한 번의 상소로 물러나지 않자, 두 번째 상소를 또 올려 윤원형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열거하여 밝힌다.
이항복은 박상의 시호를 청하는 시장(諡狀)에서 “옛말에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공(박순)을 두고 한 말”이라고 쓰고 있다.
박순이 남긴 유집 ‘사암집’
-대제학을 양보하다
‘선조수정실록’ 원년(1568) 8월 초하루의 기록에, 퇴계 이황이 홍문관 겸 예문관 대제학을 겸직하게 하는 기사가 다음처럼 나온다. “이황에게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직하게 하였다. 그때 박순이 대제학, 이황은 제학(提學)이었는데 박순이 사양하기를, ‘나이 많은 석유(碩儒, 거유)가 차관(次官) 자리에 있고 신이 후진의 초학으로서 그 위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니, 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이 명이 있었다. 그러나 (이)황이 다시 굳이 사양하여 갈리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황은 박순보다도 21년이나 연상이었고, 박순이 존경하는 대학자였다. 박순이 대제학을 흔쾌히 양보한 이유였다. 이에 이황도 “품계는 연령의 높고 낮음이나 학문이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극구 사양한 것이다.
선조는 두 사람을 함께 만나 이황에게 박순의 뜻을 따를 것을 강권했고, 결국 이황은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직하게 되고, 박순은 제학으로 내려앉는다.
대제학은 정2품, 제학은 종2품의 관직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꺼이 사양하는 모습이 실로 아름답다’고 칭송했다.
이런 박순을 이황은 “박순과 상대하다 보면 한 가닥의 맑은 얼음을 대하는 것 같이 정신이 상쾌해짐을 깨닫게 된다”고 평했다.
-시인 박순, 포천에 잠들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박순은 14년간 정승이었고, 그중 7년이 영의정이었다. 그는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료였다.
그런데 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시인’이 그것이다. 그의 ‘졸기’에 “박순은 문장에 있어 한당(漢唐)의 격법(格法)을 추복(追覆)하였고, 시에 특히 능하여 또한 한 시대의 종주(宗主)였는데, 최경창·백광훈·이달 등이 모두 그의 문인이었다”라고 나온다. 3당(唐) 시인으로 유명한 최경창·백관훈·이달의 시 스승이 박순이었다.
박순이 남긴 시 중 ‘조운백(조준용)을 찾아서(訪曹雲伯)’라는 시 하나만 소개한다. “술 취해 자다 깨어보니 신선의 집인가 싶은데, 구름 낀 널따란 골짜기에 달이 지는군. 서둘러 혼자서 쭉쭉 뻗은 숲속으로 나오니,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宿鳥)가 듣더라”
참 멋진 시다.
당시 이 시로 인해 박순에게 ‘박숙조’(朴宿鳥)라는 별명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돌길의 지팡이 소리 자던 새가 듣더라”의 구절이 너무 좋아 ‘숙조’가 별명이 됐다는 것이다.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사암 박순이 영의정에서 물러난 후 마지막을 보낸 곳은, 외동딸이 시집가 살고 있던 경기도 포천이었다. 오늘 포천에 그의 무덤과 옥병서원이 남아 있는 이유다.
그가 태어난 나주에는 월정서원이, 광주 광산구의 송호영당에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광주에 그를 기리는 도로명 ‘사암로’가 있다.
월정서원 사당 월정사(나주시 노안면 광곡마을)
송호영당 전경(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월정서원 유허비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장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유작들이 묻혀 있다가, 외증손자 때에 겨우 정리해 간행한 것이 ‘사암집’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